상세 컨텐츠
본문

국립오페라단의 세번째 정기공연이 막을 내렸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올라온 앞 두번의 정기공연과 달리 이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무대를 꾸렸다.
이번 정기공연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유독 나를 설레게 했는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내 인생의 첫 오페라가 바로 약 6년전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에서 봤던 라 트라비아타 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역시 유명한 작품으로서 라 트라비아타를 본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라 트라비아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진행된 벼룩시장에서 유명한 오페라의 리브레토를 만화로 풀어 엮어낸 만화책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당시 들어있던 오페라가 투란도트, 아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라 트라비아타였다. 즉, 내게 라 트라비아타는 오페라보다 그 이야기 자체로 익숙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르디의 드라마를 살리려고 노력한 이번 프로덕션은 내 입맛에 딱 맞춘 프로덕션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와 함께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마지막 공연을 함께 했다.

6년전 내가 만난 첫 오페라는 정말 신기했다. 오페라 라고 하면 생각나는 클래식한 이미지, 화려할 것 같은 상상속 유럽의 드레스를 생각하던 내가 무대에서 만난것은 삭막한 비탈길이 설치된 황량한 무대와 짧은 호피무늬와 같은 미니드레스를 입고 현대와 별 다를게 없던 의상의 비올레타와 다른 인물들이었다. 당시엔 사실 내가 제목을 잘못 보고 공연을 보러온건가 생각하기도 했다. 6년이 지나고 국립오페라단의 정기공연으로 라트라비아타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오페라 미리보기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서야 나는 이마를 탁 쳤다. 베르디가 전하려던 것, 공연을 올리던 당시와 불과 10년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 작품의 배경 등 나의 첫 오페라는 이런 현대성을 살린 작품이었던 것이다. 베르디는 라 트라비아타의 초연 당시 이런 동시대 드라마가 낯선 관객들로부터 큰 실패를 겪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6년전의 내가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이다.
오페라가 드라마와 음악이 함께 공존하는 공연이기는 하지만 누군가 어느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묻는다면 음악일 것이다. 커튼콜에 지휘자가 중앙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오페라 배우가 아닌 오페라 가수가 존재하는 공연! 베르디는 이런 특히 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벨칸토 오페라 유행의 시기의 작곡가이다. 하지만 그는 드라마에도 관심을 갖는 오페라 작곡가였다. 그리고 나는 이번 라 트라비아타를 보며 이런 베르디 오페라의 특징이 현재까지도 베르디의 오페라를 유명하고 계속 사랑받도록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오페라의 음악은 그대로지만 드라마는 연출을 통해 현재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이것이 다시 본래의 음악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같은 오페라가 반복적으로 올라옴에도 사랑받는 이유는 아닐까.

이번 뱅상 부사르 연출의 프로덕션은 베르디가 본래 시도하던 드라마의 동시대성과 현대와의 연결을 처음부터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에 동행한 친구는 처음 객석에 들어서서 무대를 보고 오페라공연임을 알면서도 순간 까먹고 낭독공연이냐고 묻기도 했다. 늘어선 의자와 흰 공간, 연습실을 연상시키는 이 첫무대에서 관객은 등장한 한 인물을 비올레타로 봐야하는지 성악가 자체로 봐야하는지 질문하게 된다. 아리아를 통해 나누는 그들의 대사 또한 연습실로 표현된 장소에 덧씌워져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나간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악가는 비올레타로, 관객은 그 시대로 녹아들어가게 된다.
이 때 왼편의 그랜드 피아노는 현실과 극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아이템이다. 피아노는 현실의 연습실의 존재를 상기시켜주기도 하고, 극 속 에서 비올레타와 알프레도가 지내는 집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플로라의 파티에서 무대가 되기도 하며 3막에서는 아픈 비올레타의 고독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무대디자인은 이를 사이에 두고, 또는 중심으로 하는 갈등과 그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이번 프로덕션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어린 소녀의 등장이다. 비올레타의 혼란, 고민, 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녀는 항상 뒷편에 존재한다. 그리고 문득 그 앞으로 등장하는 소녀는 비올레타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쌓여도 덮을 수 없는 근원적인 외로움, 이는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 없음을 현 시대에도 유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아마 라트라비아타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한다면 축배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번 라트라비아타를 보며 진정한 라트라비아타의 음악은 2막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개인적으로 솔로 아리아보다 합창을 좋아해서 이기도 하고, 드라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2막은 전개부터 절정까지 주요한 내용이 꽉꽉 채워진 파트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아리아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한다면 미리보기에서부터 순식간에 원픽이 된 제르몽의 아리아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떠나기전 제르몽에게 포옹을 건네달라던 비올레타의 모습이 이전 장면이었던 만큼 그리움이 느껴지는 유한승 바리톤의 프로방스의 바다와 대지는 알프레도를 향하고 있지만 비올레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더불어 강약이 뚜렷하면서도 잘 어우러지던 세바스티안 랑 레싱 지휘자의 음악은 한층 극중에 느껴지던 비올레타의 쓸쓸함과 그 쓸쓸함을 향한 따뜻함이 잘 느껴지는 지휘였다고 감히 말해본다. 새삼스럽게 뱅상 부사르 연출과 세바스티안 랑 레싱 지휘자가 계속해서 파트너로서 손을 잡는지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또한 B캐스트의 윤상아 비올레타와 김경호 알프레도의 아리아와 연기는 그 음악과 드라마를 풍부하게 채워주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나오는 비올레타의 모습은 여전히 생각만해도 금새 가슴을 저릿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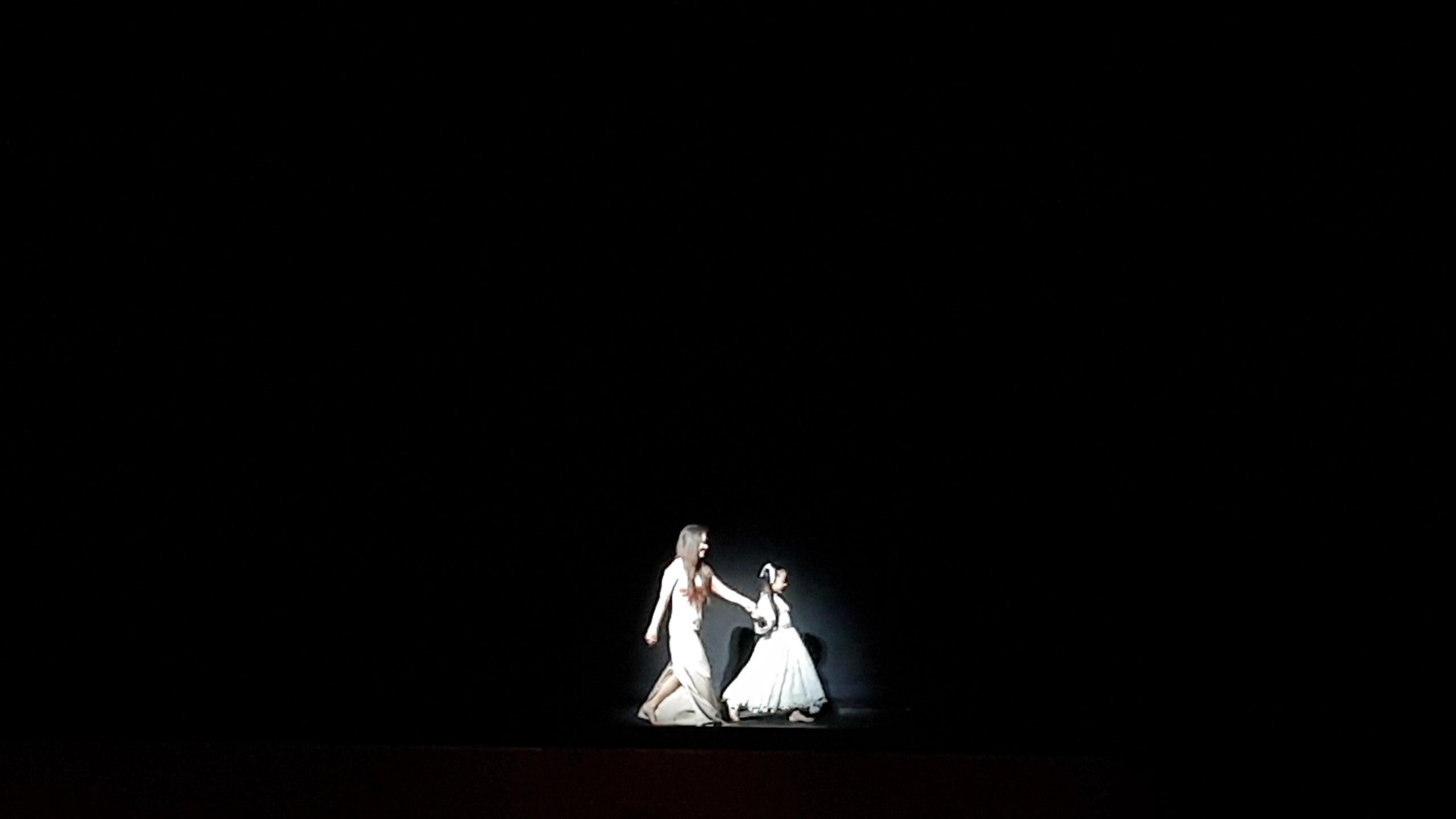

이번에 처음으로 마지막 공연을 함께 했는데 작품이 작품이어서인지 새삼 마지막의 여운이 더욱 아쉽게 다가왔던 공연이었다. 이렇게 3번째 정기공연이 막을 내렸고 올해의 마지막 정기공연인 오페라 <나부코>를 앞두고 있다. 첫번째 정기공연인 오페라 맥베스를 본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시 추워지는 날씨를 마주하니 스쳐가는 오페라 또한 너무나 아쉽게 느껴진다.
당신을 이토록 사랑한 국오단을 잊지 말아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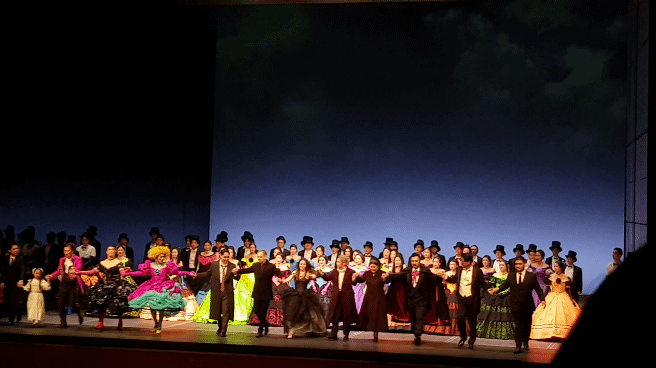
'post > KNO 오페라캐스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활동후기] Adieu, 2023 KNO (1) | 2024.01.03 |
|---|---|
| [정기공연] 오페라 나부코_REVIEW (feat. 백스테이지 투어) (2) | 2023.12.05 |
| [KNO X KNSO] 2023 블루하우스 콘서트_REVIEW (0) | 2023.09.17 |
| [정기공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미리보기 (3) | 2023.09.14 |
| [국립오페라스튜디오] 콘서트 오페라 '돈 조반니' REVIEW (0) | 2023.08.31 |



댓글 영역